화금청자 - 청자에 화려함을 두르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봉골레 파스타. 알맞게 간이 밴 큼지막한 조갯살을 씹는 맛을 잊을 수가 없다. 특히 봉골레는 계절이 바뀔때마다 가장 신선한 조개를 사용해 선보이는 만큼 다양한 조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파스타는 무조건 느끼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칼칼하게 간을 맞춘 해장파스타로도 손색이 없다.
1. 화금청자의 등장과 원나라
고려시대 화금청자에 등장한 화금청자는 원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나라가 고려에 공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화금청자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조인규가 원 세조에게 화금자기, 충렬왕 23년 성종에게 바친 금화옹기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기록입니다.
이 시대 청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은 황제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강지역의 지방지인 왕원공(王元恭)의 『지정사명속지(至正四明續志)』에서 시박물화(市舶物貨) 품목으로 고려청자(高麗靑瓷)와 고려동기(高麗銅器)가 소개하고 있으며, 조소(曺昭)의 『격고요론(格古要論)』의 고요기론(古窯器論)에는 고려 청자의 색이 용천요 청자와 유사하며 여러 화문(花文)이 시문된 것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을 만큼 중국으로 문양이 시문된 뛰어난 청자들이 거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기(沙器)를 매매하는 상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기 매매를 생업으로 삼은 상인이었던 여인을 后妃로 삼았는데(충혜왕 후 3년, 1342), 이 여인을 사람들이 사기옹주(沙器翁主)라고 불렀다고 하여 당시 사기 매매업이 신분상승에 끼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청자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에서 황제의 취향에 맞춘 화금청자를 전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규와 관련하여 『고려사』의 기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규가 일찍이 화금자기를 바치니 원 세조가“화금은 그릇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하고 묻되, 인규가 대답하기를“단지 설채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세조가 다시 묻기를“그 금은 다시 쓸 수 있느냐”하니, 인규가 대답하기를“자기는 깨지기 쉬운 것이며 자기가 깨지면 따라서 금도 떨어지는 것이니 어찌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하였더라. 세조가 그 대답을 훌륭하다 하고 이후에는 자기에 화금하지 말고 진헌하지 말라 하였다." 『고려사』 권 105, 열전 18, 조인규
조인규가 세조에게 화금청자를 전한 시기는 조인규와 세조의 문답을 통역한 사람이 강수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대령총관을 지낸 1278~1284년 사이, 조인규가 원 황실로부터 패와 관직을 받은 1280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여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1278~128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화금청자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에는 정요의 백자에 금 테를 두른 금구자기로 이해되기도 하였는데, 개성 만월대 궁궐터에서 화금청자가 발굴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 화금자기 속을 들여다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화금청자에 관해 흥미로운 과학분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개성에서 출토된 화금청자는 상감으로 문양을 낸 선을 따라 금으로 가채하고 상감이 없는 부분에는 금 안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완성된 청자 위에 금으로 채색을 하고 저온으로 3차 소성까지 진행한 것인데, 한국도자사에서 유상채 자기의 예가 거의 전무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발견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자상감원숭이문호>, 고려, 높이 25.5cm, 국립중앙박물관, 개성 106
【참고문헌】
김윤정, 「고려후기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磁器의 영향」, 『미술사학연구』249, 한국미술사학회, 2006.
황현성, 「한·중 화금자기 금채기법에 대한 비교 조사 및 가채 실험」, 『박물관보존과학』8, 국립중앙박물관, 2007.
장남원, 「쿠빌라이시대 고려·원 도자수용의 변화」,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김영원, 「新安船 磁器와 高麗 遺蹟 出土 元代 磁器」, 『미술자료』90, 국립중앙박물관, 2016.
'문화유산 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응박토도 - 충신, 간신을 가리어 세상을 바꾸다 (0) | 2022.12.14 |
|---|---|
| 이성계 사리갖춤 - 순백의 아름다움 시작을 알리다 (0) | 2022.12.06 |
| 남계우 - 19세기 살아있는 나비를 그리다. (0) | 2022.09.26 |
| 달항아리 - 백색과 불완전의 아름다움 (0) | 2022.09.08 |
| 호랑이 - 한국미술에 스며들다. (0) | 2022.08.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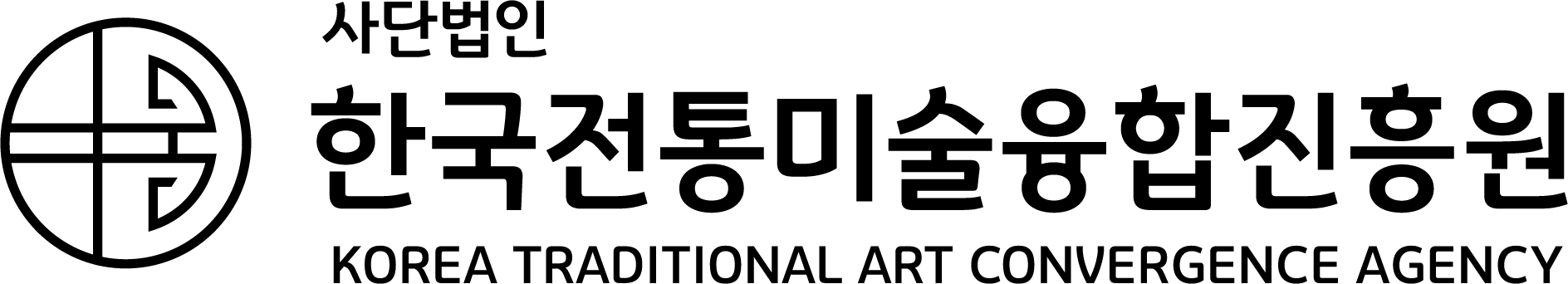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