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호(一濠) 남계우(南啓宇, 1811-1890)는 19세기에 이름을 날린 문인화가입니다. 현전 하는 남계우는 어린 시절부터 나비를 직접 채취하고 모사했던 일화로 유명하며, 현전 작품 대다수가 나비와 관련 있을 정도로 나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남계우는 '남나비'라고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남계우의 나비연구와 사실적 묘사
18세기 소론, 남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지던 시기로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백과사전들이 저술되었습니다. 남계우도 조선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 나비와 꽃 등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그림에 제발(題跋)로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화접도(花蝶圖)>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 상단의 제발 내용을 보면 『고금주(古今註)』와 『유양잡조(酉洋雜俎)』를 비롯하여 『열자(列子)』 , 『북호록(北戶錄)』 등 중국 서적에서 등장하는 나비에 대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남계우는 단순히 나비에 대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 나비의 종과 특징을 분류하여 나비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하여 묘사하였습니다.




남계우의 화접도(덕수 719)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남계우 화조영모화첩(본관 7953), 일호화첩(덕수 915)에서 호랑나비를 예로 살펴보면 실제 나비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남계우의 관찰력과 묘사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
 |
 |
| 남계우, 《화조영모화첩》, 조선, 33.7x20.6cm,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7953, 이미지 출처 : 이뮤지엄 | 남계우, 《일호화첩》, 조선, 13.7x10.6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915, 이미지 출처 : 이뮤지엄 | 이미지 출처 : Pixabay |
2. 남계우 화접도의 상징성
남계우의 나비 그림은 그의 나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연구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계우가 화접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어 했던 것일까? 그 답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화접도> 상단 제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국화는 상하걸(霜下傑)이라 부르는데 서리를 비웃듯이 꽃이 피고 그 절개를 바꾸지 않기 때 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향기는 나비를 불러들이기에 충분하고, 담담함은 고인 (高人)과 짝이 될 수도 있으니 꽃 가운데서 기품(奇品)이다.
菊稱霜下傑者, 以其傲霜而開, 不改 其節之謂. 而且香足以來好蜨, 澹可以比高人伴. 是花中之奇品也.
옛 사람은 모란과 협접(蛺蝶, 호랑나비)을 그리는 것을 풍류부귀도(風流富貴圖)라 하였는데 그것이 지극히 부귀하고 지극히 풍류하기 때문이다. 학하(鶴下) 서승선(徐承宣) 대형의 감상을 위해서 그린다.
昔人以畵牧丹蛺 蝶, 謂之風流富貴圖, 蓋其極富貴極風流故也. 寫爲徐鶴下承宣大兄雅賞.
그가 남긴 제발에는 '풍류와 부귀'라는 글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남계우는 직접 보고 연구한 것을 토대로 나비들을 표현하였습니다. 근대 나비를 연구하던 곤충학자 석주명(石宙明, 1908-1950)은 이 그림들을 보고 '서울 경기지역에 분포한 나비들만 그린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조선 후기 남계우의 그림은 조선 19세기 회화에서 관찰과 사생을 토대로 정확한 묘사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일례임을 보여줍니다.
[참고자료]
石宙明, 「一濠の湖蝶に就で」, 『朝鮮』284, 朝鮮總督府, 1939.
石宙明, 「一濠の湖蝶に就で」, 『寶塚毘蟲學報』, 1943.
이소연, 「一濠 南啓宇(1811-1890)蝴蝶圖의 硏究」, 『美術史學硏究』 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이태호, 「조선후기 화조 · 화훼 · 초충 · 어해도의 유행과 사실정신」, 『미술사와 문화유산』 2,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3.
윤종균, 「일호 남계우(一濠 南啓宇)의 나비 그림에 대한 일고찰」, 『동원학술논문집』 1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4.
'문화유산 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응박토도 - 충신, 간신을 가리어 세상을 바꾸다 (0) | 2022.12.14 |
|---|---|
| 이성계 사리갖춤 - 순백의 아름다움 시작을 알리다 (0) | 2022.12.06 |
| 화금청자 - 청자에 화려함을 두르다 (0) | 2022.11.16 |
| 달항아리 - 백색과 불완전의 아름다움 (0) | 2022.09.08 |
| 호랑이 - 한국미술에 스며들다. (0) | 2022.08.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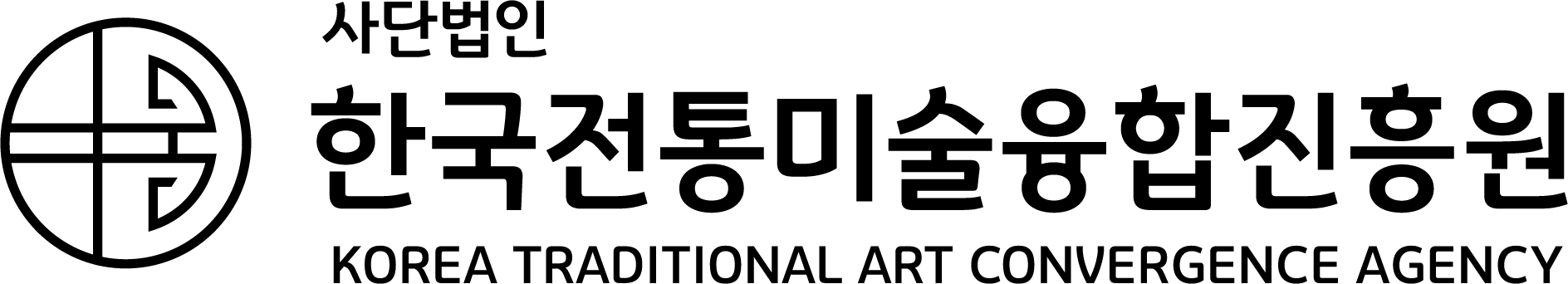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