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정의 호응박토도는 매가 토끼를 매섭게 낚아 올리는 긴장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좌측 가운데에는 '戊子夏倣寫林良'라고 적고 있어 이 그림이 1768년 여름 심사정이 명나라 화가 임량의 작품을 참고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심사정의 그림 외에도 토끼를 사냥하는 매의 그림들이 남아있습니다. 매가 사냥하는 대상은 왜 토끼였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1. 조선시대 매 그림의 유행
매를 사냥을 하는 장면은 고대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벽화나 683년 『삼국유사』의 기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게 하니 꿩이 날아서 금악(金岳)을 넘어가는데 간 곳이 묘연하였다.
(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杳無蹤迹) 『삼국유사』, 권3, 탑상 4, 영축사
조선까지도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은 자주 확인이 되며 매는 위엄 있는 동물로 왕들이 선호하는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응방에서 매를 사육하기도 하였으며 권력층에게 중요한 동물이었던 만큼 수준 높은 그림들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초부터 매 그림들이 제작되어 하사거나 진헌을 위해 사용한 흔적들이 확인됩니다.
도화원(圖畫院)에 명하여 각종(各種)의 매를 그려서 각도(各道)에 나누어 보내어 그림에 의거하여 매를 잡아 진헌(進獻)에 대비(對備) 하도록 하게 하였으니,
(命圖畫院, 摸畫各色鷹子, 分送于各道, 使之依圖捕之, 以備進獻) 『세종실록』 권 35, 세종 9년 2월 21일 기묘

|
 |
|
<태조대왕어사백송골도>, <태조대왕어사노화골도>, 목판화, 85.5×46㎝, 국립광주박물관(전주이씨 양도공파 기증)
|
|
2. 호응박토 - 매가 토끼를 잡다
조선시대 제작된 매 그림 중 꿩, 조류, 토끼 등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진 예들이 있습니다. 이중 매가 토끼를 잡고 있는 장면이 주목됩니다.
|
갈고리 발톱 무쇠 부리 눈빛은 별빛 같고
만 리라 바람 구름에 굳센 깃을 가다듬네. 맡은 직분 상구의 司寇氏였거니 교활한 토끼 피비린내 먹을 생각뿐. 깍지 중에 묶였다가 추호를 언뜻 보고 하늘 위로 솟구치니 눈빛 날개 재빠르다. 배고프면 곁에 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니 타고난 매의 성질 뉘 능히 멈추리오 |
가을 숲 안개노을이 가득한 저녁,
늙은 측백나무에 바람 불어 잎사귀가 떠네. 뒤틀린 가지에 황금색 매가 우뚝 앉으니, 다른 나무에 깃든 새들 모두 벌벌 떠네. 칼끝으로 깎아 새긴 듯한 열 두 깃털, 단번에 곧장 푸른 하늘로 속구칠 태세네. 날개가 구름처럼 펼쳐져 컴컴하고. 눈에는 번개 빛 붉기가 별이 흩는 듯. 빼어난 기운과 영웅스러운 자태는 본래 하늘이 내었으니 세상의 보통 새들은 쓸데없이 수만 많구나. 아첨꾼을 해치우고, 천년 묵은 여우도 벌써 잡았고, 교활한 놈 치고, 세 굴 드나드는 토끼를 언제나 박살 내지. 장군의 큰 저택 열어젖혀 추녀 기둥에 홀연히 이 물건을 보니 두 눈이 반갑네. 어느 아침 발이 풀려 날아갈 제 비휴나 범은 그저 땅 위로 다니지. |
|
정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효형출판사, 2003), p. 31 재인용
|
고연희, 韓·中 翎毛花草畵의 政治的 性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80 재인용.
|
시에서 나타나는 토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간신으로 비유되며 매는 이를 잡아먹는 포식자로 간신을 척결하는 일종의 충신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일본 개인이 소장 전 이징 작품인 <응도>부터 심사정, 최북 등의 그림까지 유사한 의미로서 간신이 사라진 태평한 나날이 오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최북, <호응박토도>, 41.7x35.4cm, 국립중앙박물관, 동원 2343
|
심사정, <호응박토도>, 1768, 115.1x53.6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5718
|
3. 임량과 심사정의 응도
심사정의 호응박토도에는 임량의 그림을 참고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명대 그림에 영향을 받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현의 『허백당문집(虛白堂文集)』 외에도 다양한 기록에서 임량 그림이 조선으로 들어왔음이 확인됩니다. 『고씨화보(顧氏畵譜)』 에도 임량의 그림이 전하고 있는데, 간송미술관 소장 <노응탐치(怒鷹眈雉)> 에서 심사정이 임량의 그림을 방하면서도 자신의 필치로 녹여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앞서 언급한 호응박토도에서 임량을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추정이 종합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수문 - 푸른 자연을 수놓다 (0) | 2023.02.15 |
|---|---|
| 초충 - 작은 것과 일상의 아름다움 (0) | 2023.01.26 |
| 이성계 사리갖춤 - 순백의 아름다움 시작을 알리다 (0) | 2022.12.06 |
| 화금청자 - 청자에 화려함을 두르다 (0) | 2022.11.16 |
| 남계우 - 19세기 살아있는 나비를 그리다. (0) | 2022.09.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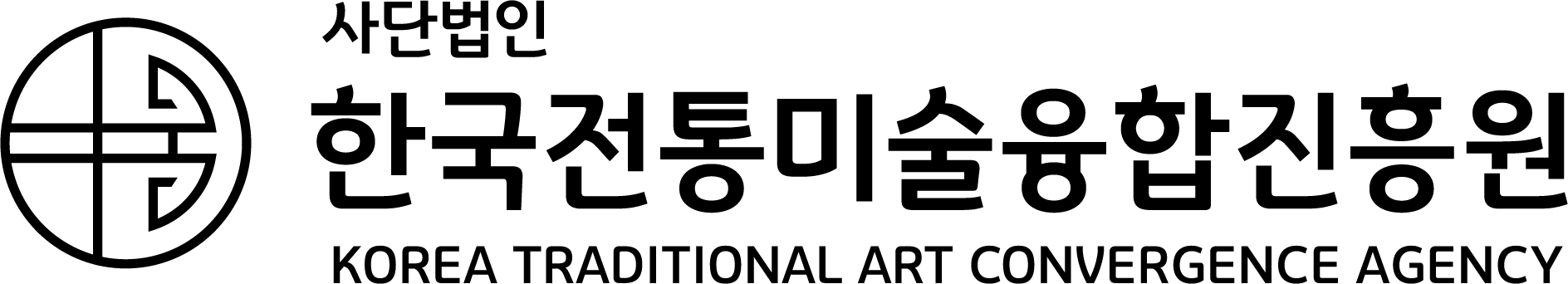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