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삼국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고전입니다. 이중 인기 있는 등장인물은 관우, 제갈공명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촉나라에서 이름을 떨친 장수 관우와 명재상 제갈공명은 현재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오늘은 명재상 제갈공명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하며 제갈공명이 인기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주자학의 발달, 후금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자학의 발달과 제갈공명
중국 삼국시대에 등장하는 제갈 공명에 대한 숭배는 남송시기에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진족이 만주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북송의 수도를 함락시켰고, 중원을 호령하던 한족은 자연스럽게 임안(현재의 항저우)으로 이동하게 되어 남송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남송에서는 중원을 호령하던 위나라보다 한나라를 계승한 유비의 촉나라에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남송의 분위를 주희는 『통감강목』에서 촉한정통론을 발전시키며 ‘삼대 이하를 의로써 논한다면 오로지 제갈공명 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촉한의 중요한 인물로 제갈공명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주희가 제갈공명을 지목한 것에는 촉한의 2가지 역사적 상황이 현재 남송과 동일시 되어 보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촉한의 국력이 위나라를 넘어설 수 없는 현실
두 번째는 제갈량이 유선에게 중원을 평정하기 위해 출사표를 올려 황실 부흥을 꿈 꾼 것
이 2가지 모습은 송이 금을 막아내지 못하고 중원을 빼앗겨 남쪽으로 내려온 상황과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남송의 과업은 금으로부터 중원을 되찾아 오는 것이 되었고, 주희는 그 중심을 잡아갈 인물로 제갈공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리학을 배우던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하여 고려 말 조선 초 주희의 『통감강목』은 널리 익히게 되었고, 제갈공명에 대한 숭배 사상이 도입이 되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청의 성장과 북벌론의 대두
조선도 남송이 겪은 역사적 상황을 17세기 지켜보게 되었으며, 인조반정 이후 호란(胡亂)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대명의리론, 북벌론의 대두, 청의 성장은 남송대 주희의 역사적 상황과 동일했습니다. 남송에는 주희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송시열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왕실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기조에서 제작된 최초의 제갈공명 상은 평안도 영유현의 와룡사에 안치했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1661년 이민서의 와룡사 중수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 그곳에 제갈공명 상을 안치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조 대왕께서 임진란 때에 용만(龍灣)까지 파천하였다가 왜적이 물러간 뒤 이 고을에 와서 머무셨는데, 매우 각별한 뜻을 두셨습니다. 그 후 이곳에 무후의 사당을 세우도록 허락하고, 본 고을의 무사를 소속시켰으며, 또한 무후의 상(像)을 보내 안치하게 하였으니, 성조의 이 일이 어찌 범연한 것이겠습니까. 7년 간의 난리를 통해 몸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 교령을 받들던 신하들 가운데에는 적을 토벌하고 국가를 부흥시킬 임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 위 문후(魏文侯)는 나라가 어지럽자 어진 재상을 생각하였고, 한 문제(漢文帝)는 흉노를 걱정하면서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을 얻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 했듯이 성조께서 호걸을 아득히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신하 가운데는 없는가.’ 한 뜻을 또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의 서쪽에 와룡산(臥龍山)이라는 명칭이 있음을 인연해서 사당을 세웠는데, 이는 사실 주자(朱子)가 여산(廬山)에 와룡암(臥龍庵)를 향사(享祀)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顯宗改修實錄』 卷6, 顯宗 2年, 11月 13日
『현종개수실록』 에 전하는 내용에는 ‘적을 토벌하고 국가를 부흥할’ 호걸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제갈공명 사당 건립 취지가 남송의 제갈공명이 유행한 원인과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제갈공명상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는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에서 전사한 윤계(尹棨, 1583~1636)를 향사하는 사당인 남양 용백사에 대한 송시열의 『주자대전』 「남양현충무문정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글에는 숭명배청(崇明排淸)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으며 실제 북벌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송시열의 『주자대전』 「남양현충무문정사기」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3. 국립중앙박물관의 제갈공명 초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한 <제갈공명 초상>(덕수 4566)에는 중국과 조선의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주는 제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행서체로 10행 8자로 남송 장식(張栻, 1133~1180)의 「제갈무후상찬」이 옮겨져 있습니다.


<공명초상>, 조선후기, 127.3x50.9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4566의 찬 내용
惟忠武侯 충무후忠武侯(제갈공명의 시호)는
識其大者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다.
仗义履仁 인의仁義를 몸소 실천했으며
卓然不舍 높고 원대한 뜻을 놓지 않았다.
方卧南阳 남양南陽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若将终身 한평생을 마칠 것 같더니만
三顾而起 삼고초려三顧草廬한 유비의 간청으로 세상에 나왔으니
时哉屈伸 뜻을 펼칠 만한 시기가 되어서다.
难平者事 평정하기 어려운 것은 전쟁이요
不昧者機 밝게 살펴야 할 것은 사물의 기미機微다.
大纲既得 큰 원칙을 이미 터득했다면
萬目乃随 작은 여러 일은 따라온다.
我奉天讨 내가 하늘을 대신해 토벌을 하니
不震不悚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惟一其心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하여
而以时动 시대의 요청에 따라 움직인다.
噫侯此心 아! 제갈무후의 이 마음은
萬世不泯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
遺像有嚴遗像有严 남긴 초상화에 엄숙함이 묻어 있으니
瞻者起敬 보는 사람은 공경심을 일으킬지어다.
<제갈공명 초상>(덕수 4337)에는 1695년 5월에 숙종의 어제와 왕의 친필임을 뜻하는 주문방인이 남아있습니다. 숙종은 “내가 서로 감응하는 바가 있어 선생의 모습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니 관건에 학창의를 입은 모습이 옛 풍속과 비슷한 듯하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함께 세상을 다스려 보지 못함이 한스러워 오로지 경모하는 마음을 기탁해 글을 쓰노라”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찬의 내용은 기사환국(1689년)에서 송시열을 사사한 후 갑술환국(1694년)에서 복관(復官)하였기에 이 제갈공명의 찬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숙종의 이러한 반응은 주자의 촉한정통론을 계승한 존주대의(尊周大義)에 의거한 행동으로 명에 대한 의리와 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1704년 이여(李畬, 1645~1718)의 의견에 송시열이 집에서 만력제와 숭정제의 제사를 지내려 했으나 몰하였고, 만동묘를 건립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점을 보아 해당 찬이 송시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송시열을 필두로 한 제자들의 재조지은이라는 정치, 역사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에 그린 제갈량 초상
참고 문헌
김기완, 「초상화찬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제갈량 초상 담론」, 『우리어문연구』72, 우리어문학회, 2022.
김기완, 「조선후기 제갈량 담론의 지속과 변용 - 북벌 담론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72, 대동한문학회, 2022.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고사인물화』2, 국립중앙박물관, 2016.
'문화유산 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화유산 추천] 신라, 천불의 현현을 바라다 (0) | 2023.09.22 |
|---|---|
| [문화유산 추천] 신라의 염원과 표현, 기마인물형토기 (0) | 2023.08.29 |
| [문화유산 추천] 호우총 청동 그릇 – 이름으로 역사를 그린 그릇 (0) | 2023.07.12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6회 기본, 심화 대비반 모집 (0) | 2023.06.19 |
| 조선백자, 철화로 조선의 해학을 그리다. (0) | 2023.05.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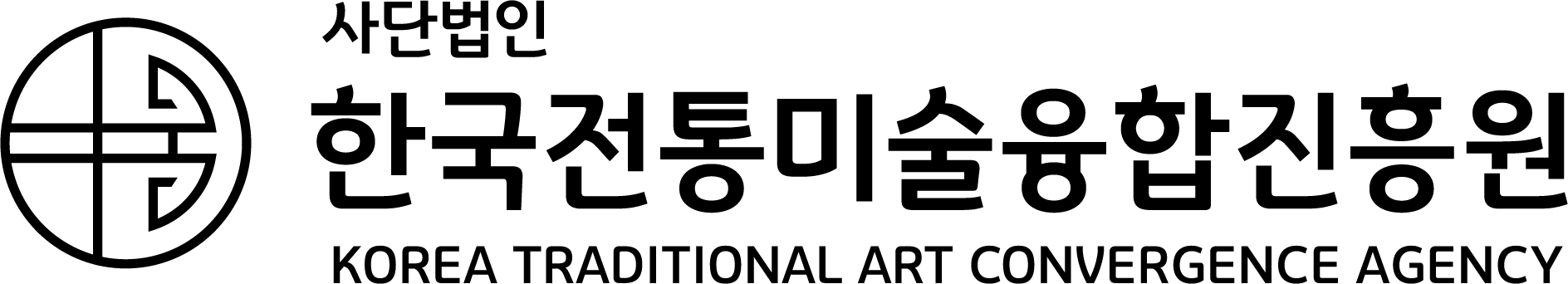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