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경주 시내에서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는 노서동 140호분에서 고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140호 고분은 봉분이 파괴가 많이 되었고 근처에 민가가 들어서 노서동 고분군을 발굴할 때 가장 먼저 발굴해야할 고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6년 140호분을 발굴한 결과 2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붙은 형태였고 남쪽 고분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청동 그릇이 발견되면서 호우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북쪽 고분은 은방울이 출토되어 은령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 호우총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청동 그릇
청동 그릇 밑 바닥에는 4행 4자씩 총 16자의 글씨를 기록해두었습니다.


乙卯年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면
을묘년 /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 십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재위 391~412)은 시호이며, 광개토대왕이 재위한 시절에는 을묘년이 없기 때문에 청동 그릇에 기재한 을묘년은 광개토대왕의 서거한 412년 이후 을묘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청동 그릇에 쓰여진 글씨는 의미는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왕을 기념 혹은 추모하기 위한 호우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동 그릇이 제작된 을묘년은 언제일까하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기존에 호우총은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적석목곽분 편년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우총에 들어간 이 청동 그릇의 하한 연대는 6세기 초 또는 6세기 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라로 고구려 청동 그릇이 들어온 흔적을 추적해보면 기록 상에서 뚜렷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을 준비하여 475년 백제 개로왕을 살해하는데 긴장감이 극에 달한 시기에 고구려와 신라가 우호의 선물을 주고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조금 더 고려해본다면 이 청동 그릇과 유사한 그릇이 언제 만들었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일 겁니다. 중국에서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보주형 꼭지가 있는 청동합은 중국 집안시 국내성 내 집안현, 마선구 940호분에서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마선구 940호분은 적석총과 석실을 갖춘 봉토분의 전환기에 있던 것으로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중엽 사이에 제작된 그릇임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
호우총 출토 청동 그릇과 유사한 보주형 꼭지의 청동 그릇
(사진 출처 : 강현숙, 「고구려고분과 신라 적석목곽분 교편년에서의 몇 가지 논의」 , 『한국상고사학보』87, 한국상고사학회, 2012, p. 86, <그림 1>) |
호우총의 청동그릇은 415년 을묘년에 제작하여 신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의 의미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 어떻게 신라 무덤에 묻히게 된 걸까요? 415년에 만들어진 청동 그릇이 6세기 초에서 6세기 전반에 조성된 호우총에 묻히게 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415년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중요한 외교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물왕의 아들인 실성왕과 복호가 신라 실성왕이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이 『삼국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볼모로 잡혀간 이유는 내물왕 치세에 왜가 침략했을 때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리치면서 고구려의 내정간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호가 418년 신라로 돌아오면서 청동 그릇을 신라로 가져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는 점과 피장자의 착장 유물에 따른 위계를 보았을 때 방계나 서자가 호우총의 주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품제를 유지하기 위해 신라 내에서는 성골 간 근친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호우총에 묻힌 사람은 복호의 직계이거나 복호의 자손이 눌지의 자손들과 혼인으로 엮이는 과정에서 호우총에 묻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로 볼 때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한 물건을 제작한 후 5세기 전반 지참하도록 하여 신라에 보내져 호우총에 같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조우연, 「"太王敎造" : 4~5세기 고구려 명문 기물 재검토」 , 『고구려발해학회』57, 고구려발해학회, 2017.
강현숙, 「고구려고분과 신라 적석목곽분 교편년에서의 몇 가지 논의」 , 『한국상고사학보』87, 한국상고사학회, 2012.
김용성, 「호우총의 구조 복원과 피장자 검토」 , 『선사와 고대』24, 한국고대학회, 2006.
참고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화유산 추천] 신라의 염원과 표현, 기마인물형토기 (0) | 2023.08.29 |
|---|---|
| [문화유산 추천] 촉한의 명재상 제갈공명 조선에 깃들다 (0) | 2023.07.31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6회 기본, 심화 대비반 모집 (0) | 2023.06.19 |
| 조선백자, 철화로 조선의 해학을 그리다. (0) | 2023.05.24 |
| 부석사 괘불 - 사람들의 염원을 담다 (0) | 2023.04.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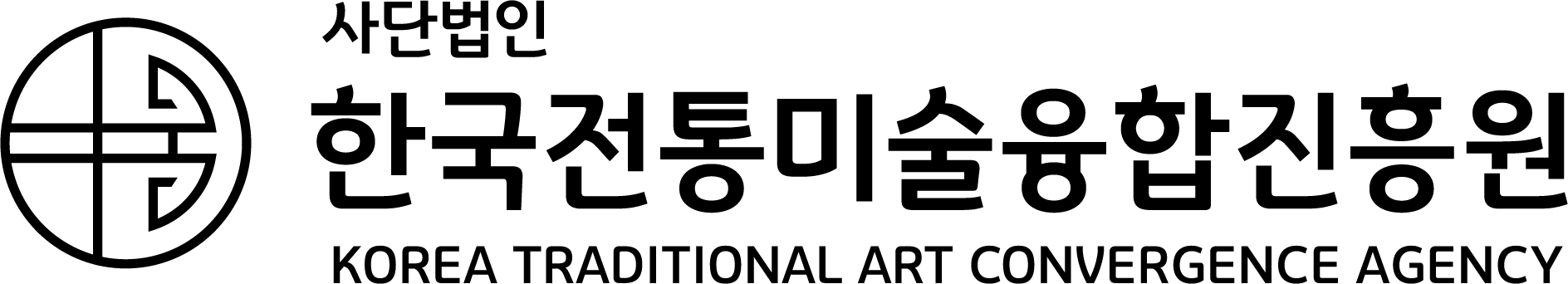




댓글